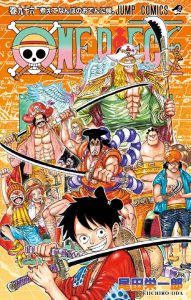눈을 떠 보니 중2 때 썼던 소설 속 안이었다. 그것도 한쪽 눈에 안대를 끼고, 왼팔에 흑염룡을 달고 다니는 솔레이 공작가의 외동딸인 레이나로.
[불렀는가 주인.]
“으아아아악! 내 왼팔에서 당장 사라져!”
문제는 저질러 놓은 흑역사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다.
“아가씨. 그러면 이 죽음의 드레스도 버릴까요?”
“응.”
“그러면 이 선혈의 구두는요?”
“버려.”
“네. 그러면 핏빛 재앙의 머리띠도 버릴게요.”
아니 왜 다 이름이 그따위인 건데?
설상가상, 제게 무릎을 꿇으며 충성을 맹세하게 한 놈들까지 요란하게 날뛰기 시작한다.
“간단해. 기절하면, 무섭지도 않고 좋잖아?”
“벽이라도 부숴야 그 위에서 내려올 건가.”
“괜찮아! 딱 한 대만 때렸어.”
……어째 이제는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될 것 같다.
과거에 뿌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고군분투하는 레이나의 이야기.
During my edgy emo teenage years, I wrote a novel about Reina, the only daughter of the Duke of Solei, who wears an eye patch in one eye and a black dye dragon on her left arm. The ultimate moody emo villainess with skull decorations and black roses on everything she owns… The ultimate symbol of my dark and moody past – and now I am suddenly her?! To make matters worse, even the overpowered minion characters who I made swear their allegiance to me have now started running wild… to the point that I’m the one who feels like begging on my knees. This is enough! Just, why is everything so embarrassingly overdramatic? It’s time to clean up my dark past!